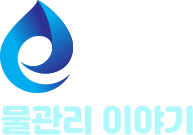정책포커스
기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디지털 물관리
김 동 진 원장 / 국립환경과학원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나가 홍수나 가뭄, 수질 오염 등으로 나타나는 물 분야이다. 현재 유럽은 5백 년 만의 최악의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 8월 초 서울 등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 폭우가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80mm를 넘는 115년 만의 기록적 강우로 큰 피해를 보았다. 반면 남부 지방에서는 올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상 가뭄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비상 용수공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의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6년간(1912~2017년) 연평균기온이 약 1.8℃ 상승하여, 전 지구 평균 온난화(0.85℃) 대비 더 빠른 온난화 속도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폭우, 폭염, 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2020년 6~8월간 중부지역 장마가 54일간 이어져, 1973년 통계 작성 이후 최장기간을 기록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 적용된 예측모형에 따른 기상청의 분석 결과를 보면 21세기 후반까지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수량이 현재보다 약 2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는 디지털 물관리 사업을 통해 이러한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서는 물 관련 데이터의 통합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기관별로 산재한 수질, 수생태, 수자원, 수문, 지하수 등 각종 물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물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을 통한 홍수예보, 센서와 CCTV 등을 통한 실시간 하천 감시체계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수위 변화에 따른 댐·하천 시설물의 원격제어 등 디지털 하천관리 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하여 홍수·가뭄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수질 및 수생태 측정망과 물 환경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통합시스템의 토대에서 최적의 물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물관리 디지털트윈’을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트윈’은 실시간 데이터를 매개로 현실 세계와 디지털 모사체가 연결되는 것이다. 물관리에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유역, 하천, 댐, 저수지, 상하수도 관망 등에서의 물 흐름과 수질 변화를 하천유량, 수질 등의 측정 자료를 매개로 가상공간에서 재현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2020년부터 ‘전 지구 수문 디지털트윈(Digital Twin Earth-Hydrology)’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각종 자동 측정 시스템(TMS) 데이터를 디지털트윈의 유역-하천 모델로 시각화하여 실시간 재현함으로써 물관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최신의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기후 영향 예측 등 최적의 시나리오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결정자는 전국의 물관리와 수질 현황과 전망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고 물 수급이나 녹조 등에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통합 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누구나 깨끗한 물을 걱정 없이 이용하고 홍수와 가뭄 같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물관리 정보를 통합하고 스마트 기반 물관리 기술 고도화, 디지털트윈 의사결정시스템 등 과학적 물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